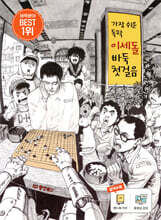
인생에 있어서 늘 옳은 것처럼 굳어져 바둑의 정석처럼 여겨지던 것들도, 또 다른 반대의 도전에 의해 무너지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함의를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함의는 결국 합의에 이르러, 다시 또 다른 규칙과 정석을 만들어 낸다.
바둑과 정·반·합
— 한 수의 승부가 아니라, 사유의 대화.
바둑을 두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이 수는 좋은 수 입니까, 나쁜 수 입니까?”
그러나 바둑판 위에는 처음부터 좋은 수도, 나쁜 수도 없다. 다만 지금까지 옳았다고 믿어온 수와, 그 믿음을 흔드는 상대의 한 수가 있을 뿐이다. 이 지점에서 바둑은 단순한 게임을 넘어 철학의 언어를 갖는다. 바둑은 정·반·합이 가장 정교하게 작동하는 사유의 장이다.
바둑에서 ‘정(正)’은 정석이다.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과 승부의 기억이 만들어낸 질서다. 초반에는 세력을 넓히고, 약한 돌은 지키며,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다. 이 정은 바둑판을 안정시킨다. 그러나 정은 언제나 한계를 안고 있다. 정석은 항상 옳아서 정석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옳았기 때문에 정석이 되었을 뿐이다. 상대가 그 정석을 벗어난 수를 둘 때, 바둑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수는 반(反)이다.
반은 틀림이 아니다. 반은 질문이다.
“당신이 믿는 그 질서가, 지금 이 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
바둑에서 상대의 한 수는 공격이 아니라 내 사고에 대한 반론이다. 그래서 바둑은 싸움이 아니라 대화에 가깝다. 정과 반이 충돌하면 판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인다. 정석을 따른 돌은 답답해 보이고, 정석을 깬 돌은 무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판 전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간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합(合)이다.
합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니다. 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반이 무조건 옳아지는 것도 아니다. 합은 판 전체가 더 높은 차원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다. 한 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판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지점도 여기에 있다. 하수는 정에 집착하고, 반을 틀렸다고 단정한다. 고수는 정을 존중하되 집착하지 않고, 반을 배척하지 않고 흡수한다. 고수는 상대의 수를 꺾지 않는다. 상대의 생각을 판 안으로 끌어안아 더 넓은 그림을 만든다. 그래서 바둑은 승패의 기록이 아니라 사유의 흔적으로 남는다.
바둑이 인생에 비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삶의 선택 역시 언제나 정과 반 사이에서 흔들리고, 그 충돌 속에서만 비로소 자신만의 합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정만 고집하면 삶은 굳어지고, 반만 외치면 삶은 흩어진다. 합이 있을 때, 인간은 한 단계 성숙한다. 바둑판 위의 한 수는 말이 없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인간은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다.
어쩌면 바둑은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게임이 아니라, 다름을 껴안는 법을 가르치는 철학인지도 모른다.
-만두의 객석,법무사 권두안JD-
